상세 컨텐츠
본문
저자: 成田道廣(나리타 미치히로), 天理敎 海外部 繙繹課
출처: 《글로컬 텐리(グローカル天理)≫ 제8호(통권 212호), 2017. 8, 6쪽.
번역이란 무엇인가

말과 행동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언어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나 문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번역의 경우에도 문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고고한 언어 철학을 내세운 비트겐슈타인(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은 말의 의미나 문법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용에 주목했다.
"사람은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언어의 의미란 언어 속 그 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사람들은 곧잘 그 (사용-역자 주) 담당자를 지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비트겐슈타인, 1985:256)
그는 언어란 ‘세련화(미세하게 만드는 것) 하는 것’으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인용하면서 "최초에 행동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행동에 의해 비로소 말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실제 행동이야말로 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비트겐슈타인, 1997:86). 예컨대 ‘푸른 하늘’의 경우 그 ‘푸른’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가. 푸르다고 말하더라도 신호등의 푸른색, 코발트 빛 바다의 푸른색, 청사과의 푸른색, 쪽빛의 푸른색 등 그 인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역자 주) 비교하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분석하거나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푸르다’라는 말 그 자체로부터 최종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 즉 색 그 자체의 개념, 색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푸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의 배후에 암묵적인 상호 이해가 있기 때문인데, ‘푸른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즉 그 담당자가 암묵적인 상호 이해에 기대어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경우, 항상 이 상호 이해라 할 생활의 형식이 선행한다. 그 형식이 사용되어 비로소 말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말은 그 관용적 사용에 의해 하나하나 의미를 획득해 간다. 그 과정은 마치 한수 한수 진행되는 체스의 말과 같은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언어 게임’이라 이름 붙였다.
"철학은 어떤 식으로든 언어의 실제 관용적 사용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런 까닭에 철학은, 최종적으로는, 언어의 관용적 사용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비트겐슈타인, 1976:104)
그는 언어 게임이라 부르는 언어의 관용적 사용을 철학에 의해 확고한 토대 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가능한 것은 단지 기술하는 것뿐이어서, 말의 논리적 측면이나 문법은 그 언어의 관용적 사용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사용됨으로써 그 관용적 양식이 형성된다. 그 뒤를 문법이 좇아가게 된다. 즉 문법이란 항상 배후의 존재인 것이다.
"‘언어 게임’의 근원, ‘언어 게임’의 원시적 형태는 반작용인 것이다. 반작용에 의거하여 비로소 더욱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비트겐슈타인, 1997:86)
더욱이 그는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말의 관용적 사용은, 그 사용의 반작용에 의해 더욱 복잡하게 심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말의 관용적 사용이 성장해 가는 데에는 그 반대를 향하는 힘, 즉 대극적 개념이 전제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말의 의미가 다른 말과의 관계성에 의해 한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말은 담당자가 제어(control)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게 된다.
번역자는 그의 번역 작업을 통해 종종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 말의 창조자인 번역자라 할지라도 그 말이 이후 어떻게 수용되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 파악 또는 조절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새로운 말은 신선한 씨앗과 비슷하다. 그것은 대화(discuss)라고 하는 땅에 뿌려진다"(비트겐슈타인, 1997:13)라고 말하고 있듯, 번역자는 부모 곁을 떠나는 자식을 대견스레 지켜보듯이 그저 만들어낸 말의 관용적 사용과 그 수용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존재와 같은 것이다. 대화라고 하는 토지에 뿌려진 씨앗은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수용되어 정착해 간다. 그 사용이야말로 말의 본질이며, 사용에 의해 획득된 개념이 그 말의 의미가 된다. 그 의미는 번역자가 상정하고 있던 의미와 합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번역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근심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그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 번역자의 사명일 것이다.
이런 웅장한 ‘언어 게임’은 우리가 말을 매개로 상호 공감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비트겐슈타인은 "타인은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명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과 같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한, 그에 한해서는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비트겐슈타인, 1976 : 181)
그는 말을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말의 의미에 관한 주관적 태도를 상술한 ‘아픔’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용하여 부정했다. 아픔이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관적 말이라도, 나와 타인의 관계성으로부터 그 의미가 성립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나는 아프다’라고 하는 발화는 고통의 신체적 표현이며, 이를 인식하는 타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감각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대응 관계에 의해 ‘아픔’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립한다. 어떠한 체험이라도 타자에 의해 명명됨으로써 비로소 말로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아픔’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술한 언어 게임에서의 관용에 의거하고 있다. 그의 지적은 감정 이입이라는 인간 본래의 본질적 구조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번역 가능성의 실제적 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언어 철학에는 일관되게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말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가로 놓여 있다. 그의 사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인용문헌】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 탐구(哲學探究)」, 후지모토 다카시(藤本隆志) 역, 大修館書店, 1976년.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고(論理哲學論考)」, 후지모토 다카시 ‧ 사카이 히데히사(坂井秀壽) 공역, 法政大學出版局, 1985년(제18쇄).
-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반철학적 단장(反哲學的斷章)」, 오카자와 시즈야(丘澤靜也) 역, 靑土社, 1997년(제2쇄).
'동아시아 불경의 번역 수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교 언어의 번역(1) - 성스러운 말씀 (0) | 2022.04.16 |
|---|---|
| 번역과 언어 철학(2)- 태(Voice)와 세계관 (0) | 2022.04.15 |
| 번역과 해석학-해석의 지평 (0) | 2022.04.04 |
| 번역과 언어학(3)- 번역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0) | 2022.04.03 |
| 번역과 언어학(2)- 번역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0) | 2022.0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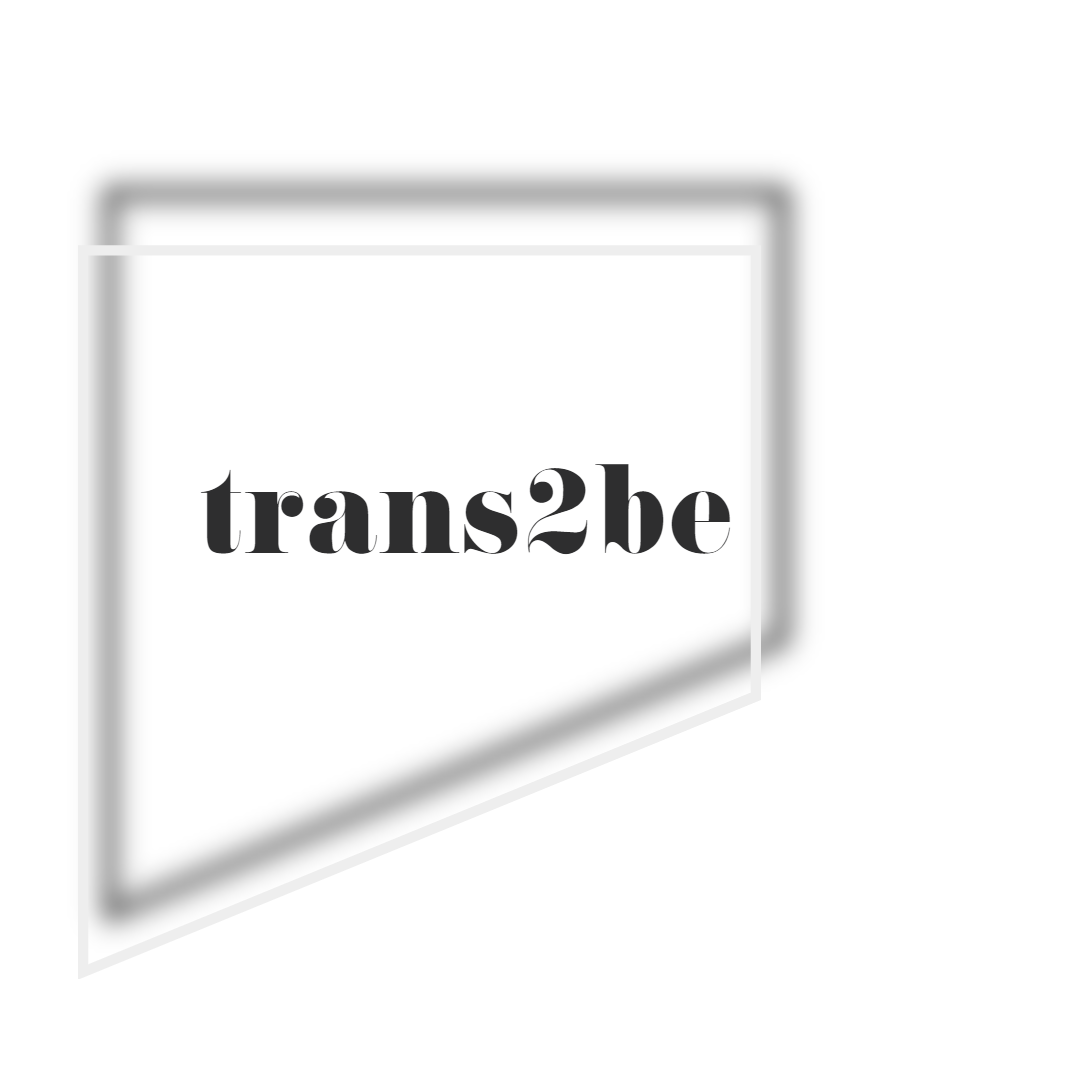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