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저자: 成田道廣(나리타 미치히로), 天理敎 海外部 繙繹課
출처: 《글로컬 텐리(グローカル天理)≫ 제10호(통권 214호), 2017. 10, 9쪽.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Voice)와 세계관
동서양을 불문하고 말에는 시제나 상(aspect), 태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문법에서 중요한 범주이다. 번역에서는 이들 범주를 기점 언어로부터 목표 언어로 충실하게 옮길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각각의 언어와 문법에는 독자의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어서 번역할 때에 다양한 곤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유럽 언어, 특히 영어에서는 능동태(active voice)와 수동태(passive voice)라는 도식만으로 태를 말할 수 없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에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동태(middle voice)라는 범주가 존재했었다. 독일어나 프랑스어에는 중동태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재귀적 용법이 남아 있고, 영어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 I am interested in linguistics.(나는 언어학에 흥미가 있습니다.)
- I was born in Japan.(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의 경우 문장 자체는 수동태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능동적이다. 이와 같은 문장은 중동태의 흔적으로 보인다.
같은 인도-유럽어족의 언어 가운데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에는 반사태라는 이름의 중동태가 존재하고 있다. 산스크리트 문법에는 능동태(parasmaipada)와 반사태(反射態, Ātmanepada)의 구별이 존재한다. 이 구별은 동사의 작용이 누구를 위해 행해지는가에 따른 것이다. 능동태는 어떤 동사의 작용이 타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사용되고, 역으로 그 동사의 작용이 자신에게 미칠 경우에는 반사태가 된다. 이 경우 동작 주체에서의 나와 남의 구별은 없다. ”제사를 지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yaj’를 예로 들어보면, 이 동사에는 두 가지의 태가 있는데, 능동태인 ‘yajati’는 ”그(제사관)는 (제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의 의미가 되고, 반사태인 ‘yajete’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의 의미가 된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자동사나 타동사와 함께 태에 의한 명확한 구별이 존재한다. 이는 그 구문에 기초한 논리 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전해오고 있는 베다(Veda) 경전과 같은 종교 문헌에서는 이 구별을 명확하게 의식함으로써 복잡 혹은 난해한 의미 세계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베다 경전에 기초한 세계관과 신관은 내재적 또는 일원적인 까닭에, 동작의 작용이 타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 논리상 상정될 수 없다. 세계의 근본 원인은 모두 귀일하는 ‘안’, 즉 절대적 또는 유일한 존재로, 타자라 불릴만한 ‘밖’을 갖지 않는다. 더구나 베다의 세계관에서는 자기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근원이자 초월적 존재와 동일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자신의 범위는 그 한계가 없다. 따라서 ‘나야말로 우주이며 우주는 나인 것이다’라는 베다의 세계관에서 자신의 의식이 미치는 범위를 자신의 공간이라 한다면, ‘내가 걷는다’와 같은 극히 당연한 능동태의 문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이 ‘나’의 의식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는다’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이나 상황까지 포괄하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걷는다’는 것에 대한 필수 조건도 제멋대로이다. 나와 남의 구별이나 의식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차원, 타동성과 자동성이 요동하는 세계를 능동태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능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사태는 통상 수동태로 표현한다. 능동태로 ‘하다’로 표현되는 것은 수동태로는 ‘되다’가 된다. 이 양자 간의 관계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하다’나 ‘되다’로 환언할 수 없다. "내가 걷는다"를 "내가 걷게 되고 있다"로 말을 바꾸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는 사죄하게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찌 될는지는 구태여 말할 것도 없다.(고쿠분 고이치로(國分功一郞), 2017:21)
고쿠분의 지적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어쩐지 이 구별은 매우 부정확하다. "내가 걷는다"는 문장이 드러내는 사태는 실은 "나에게 걷는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걷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식이 몸 전체에 지령을 내려서 걷고 있을 리 없고, 또 걷는 법을 항상 지시하고 있을 리도 없다. 즉 능동태의 문장이라도 그 문장이 반드시 능동성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 "내가 걷는다"를 수동태로 했을 경우 "내가 걷게 되다"가 되어 양자의 차이는 자신의 ‘의지’ 유무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의지’에는 어떤 애매함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내 팔을 들어 올릴" 때, 내 팔은 들린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내가 내 팔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내 팔이 들린다"는 사실을 빼면 거기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비트겐슈타인, 2013:313)
거기에 남는 것은 ‘의도’나 ‘의지’라 불리는 것으로, 실은 그것들은 구문의 차이 즉 구문이 초래하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지적하고 있다.
이 ‘의지’란 스피노자가 "자유로운 원인이라 불릴 수 없고 단지 필연적 혹은 강제된 원인이라고만 불릴 수 있다. 의지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사유의 어떤 양태일 뿐"(스피노자, 1975:75)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항상 다양한 영향을 서로에게 끼치는 인간 존재에게 고정적 혹은 완전한 자유 의지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능동성이나 수동성에 속하지 않는 사태, 즉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어서 강제적이지도 않은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중동태이다.
번역할 때 주어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나 주어-술어 관계가 얽혀 있는 문장을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능동태인가 아니면 수동태인가라는 매우 강고한 틀로 수렴될 수 없는 사태는 중동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드럽게 자연적인 ‘힘’이나 ‘작용’을 유연하게 표현하는 중동태는 많은 언어에서 점차 더 명확한 작용을 표현하는 자동사나 수동태로 변화하였다. 그 잃어버린 태를 불이일원론적(不二一元論的) 세계관이나 자연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번역은 ‘선택’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듯 함축성 있는 번역을 추구하더라도, 번역문은 때때로 양자택일의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종교 언어의 번역에서는 이와 같은 마찰과 갈등이 끊임없이 따라 다닌다. 태의 ‘사이’에서도 번역자는 사라진 태를 찾아 ‘지평의 융합’을 목표로 삼아 험준한 길을 걸어간다.
【인용문헌】
'동아시아 불경의 번역 수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교 언어의 번역(2)- 원전의 부활 (0) | 2022.04.18 |
|---|---|
| 종교 언어의 번역(1) - 성스러운 말씀 (0) | 2022.04.16 |
| 번역과 언어 철학(1)-말과 행동 (0) | 2022.04.06 |
| 번역과 해석학-해석의 지평 (0) | 2022.04.04 |
| 번역과 언어학(3)- 번역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0) | 2022.04.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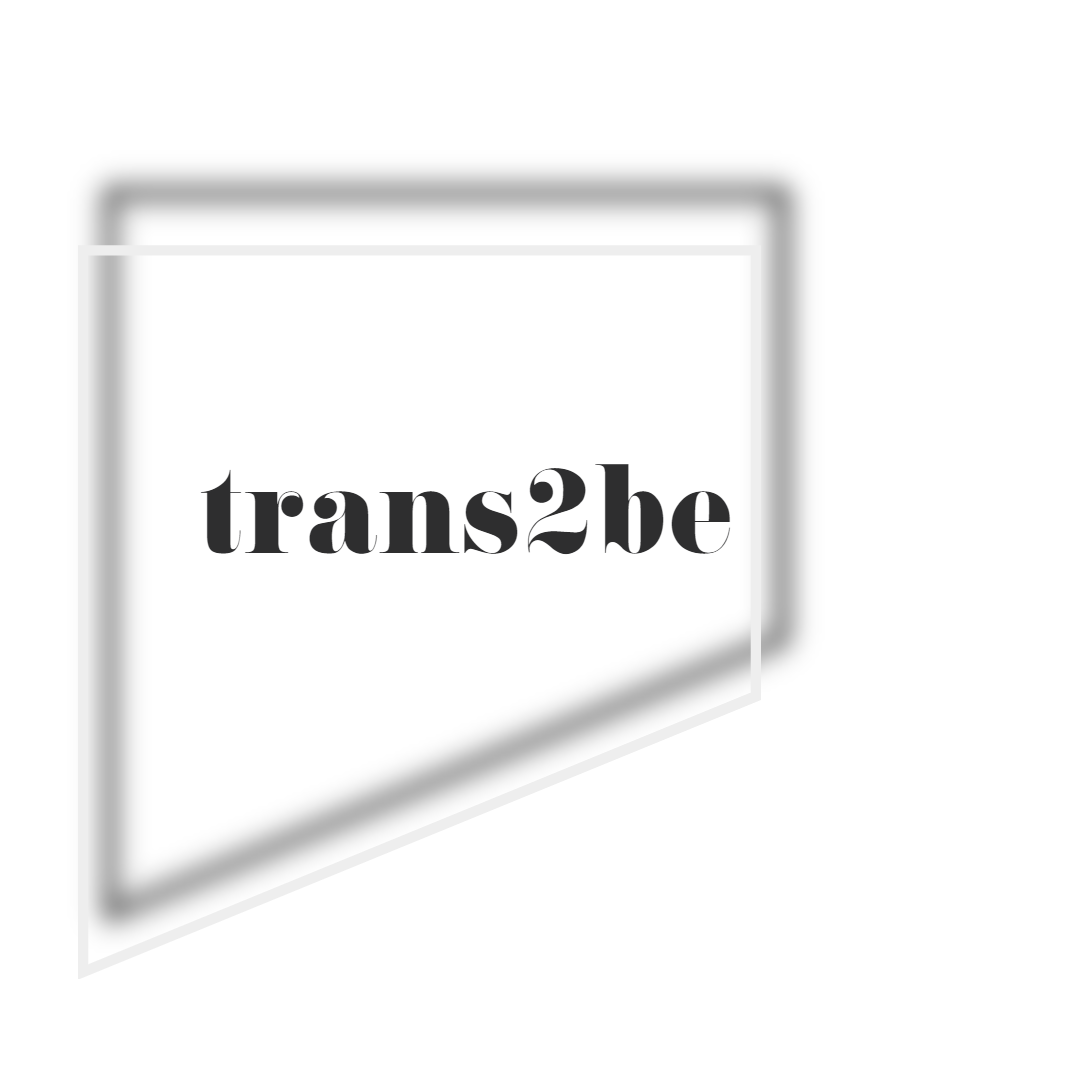





댓글 영역